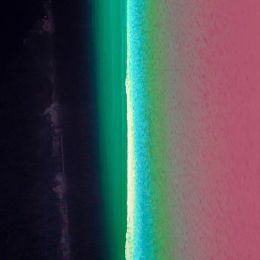해경님의 음악은 오롯합니다.
세심하게 조율된 음과 단어의 배치, 단정한 터치의 기타.
배음과 딜레이, 리버브, 퍼지한 텍스쳐들을 깎고 채워 만든 특유의 공간.
[나의 가역반응] 때부터 독보적으로 완성된 사운드는 그의 인장이면서, 종종 관성이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 해경님과 함께 해 온 분들이라면 [최저낙원]을 스치듯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렇기에, 저희에게 [최저낙원]은 해경님의 음악 여정의, 어떤 예정된 변곡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저낙원]은 들을 때마다 그 무늬와 표정이 바뀌는 앨범입니다.
생애 동안 시인이면서 건축가였고, 화가이면서 (영 소질이 없던) 카페 사장이기도 했던 김해경, 또는 이상 처럼요.
[최저낙원]은 격정적이고 불온한 곡들의 모음이며, 이전 ‘신해경 앨범'의 서사로부터 이질적인 순서와 배치를 의도한 앨범입니다.
순서나 전개, 볼륨과 밸런스까지 한 채의 건축물처럼 짜여올려진, 치밀한 ‘설계'와 ‘직조'의 의도가 담긴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분명 한 방향으로 선명히 흐르는 앨범인데, ‘감정둔마'를 앞뒤로 대칭되는 구조화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아스피린 오버도즈'는 앨범의 머릿곡이면서, 앨범을 소개하는 타이틀곡입니다. ‘수박주스꿈'으로 불리던 곡이기도 하고요.
특유의 나른한 드림팝 무드로 시작해, 짧은 불협음과 함께 몰아치듯 전환되는 이 곡은, 각 파트를 굳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않음으로서 감정의 급변과 파고를 있는 그대로 담아냅니다.
꿈결 같은 풍경도, 감성적인 보상감도 분명 알뜰하고 노련하게 가져가는 곡입니다. 해경님 음악의 에센스를 밀도 있게 담아냈기에, 포만감 있는 감상 경험에 보다 빠르게 이르고, 그 잔향이 오래 머무르는 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곡이 전개되는 방식에서 전환의 방식, 타이밍이나 메시지는, 청자가 기대하는 관성에서 모두 조금씩은 어긋나 있습니다. 익숙한 재료들로 탄탄하고 미학적으로 구축된 곡이지만, 그 방향성이 청자보다는 불안한 화자의 심리를 향해있기 때문이지요. 이 점에서 ‘아스피린 오버도즈'는 [최저낙원]의 두 면면 - ‘신해경 음악'의 관성과 이로부터 이탈하는 이질성 - 을 두루 담은 채, 뒤이어질 곡들로 듣는이를 연착 시킵니다.
‘아스피린 오버도즈'에서 시작된 [최저낙원]의 전반부는 기타와 노이즈, 이펙트를 채우고 뒤틀며, 끊거나 밀어부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거친 질감의 기타가 배킹으로, 제2의 화자로, 전환의 장치로 종횡무진하며 의외성을 극대화하는 ‘반달리즘',
노이즈락/슈게이징의 클리셰들로 시작하지만 루핑하는 패턴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주를 더한 ‘만화경'에 이르기까지.
불균질한 전환, 쌓아올린 공간을 파괴하듯 들어오는 왜곡-분절된 트랙들은 흡사 강박처럼, 주요한 위치마다 자리합니다.
소담했던 ‘어떤날' 속 익살의 연장선으로만 보기엔, 그 연출의 빈도와 강도가 한결 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감정둔마'를 가운데 두고 이어지는 후반부는 [최저낙원]에 보다 복잡한 정서를 부여합니다.
앨범에 내재된 ‘상처'와 ‘상실', 이를 삐딱하게 대하는 자조적인 정서는 전반부와 연결되지만,
내밀하고 소상하게 상처를 드러내는 가사와 정형화된 장르-스타일의 송폼 및 사운드 메이킹은 각자 고립되거나, 서로 분열합니다.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간명한 구성, 원망과 위로 사이를 오가는 의뭉스러운 가사로 희미한 불온함을 쌓는 ‘인디에게',
80년대 일본 골든 에이지의 음악을 연상시키는 볼드한 코드워크 위에, 앨범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정서를 노래하는 ‘나의 크로노스'는
‘나'만큼이나 ‘너/그대'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곡입니다.
‘닿고자 하는' 정서가 아닌 ‘단절되고자 하는' 표현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간간이 그간 닿았던 ‘우리'라는 말도, 이 즈음부터 자취를 감추죠.
해경님의 앨범에서 마지막 곡은 늘 이 앨범의 서사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화학평형'은 [나의 가역반응]에 여러 결의 모호한 서사를 남겨둠으로서 그 전후에 대한 상상의 여지를 심었고,
‘꽃피는 계절처럼'은 확실한 결말과 보상감으로 [속꿈, 속꿈]의 서사를 완결시켰죠.
떨궈내리는 타감을 드러낸 건반음과 유약하게 떨리는 보컬 위에 현의 울림을 더한 [최저낙원]의 마지막 곡,
‘줄무늬 카네이션'은 러닝타임 동안 절정에 이르는 보상감을 선사하거나, 위안과 희망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확장되지만 확산되지는 않는 사운드와 함께 느릿하게, 침잠하듯 마무리되죠.
이 과정에서 보컬과 그 가사는, 먼지를 걷어낸 옛 건물처럼 더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 부정의 대상을 자신 안으로 가져오는 자책,
그리고 이에 대한 회피 또는 체념과 같은 쓸쓸함 이라는 사실에 이르면, [최저낙원]은 운명론적인이야기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곡, ‘줄무늬 카네이션'은 [최저낙원]이 앨범 속 화자의 체념의 일대기이자,
노랫말을 부르는 해경님 본인의 이야기임을 여러 연출과 장치들로 은연 중에 드러냅니다.
[최저낙원]은 이질적인 ‘순간'들을 연결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때로는 치밀하게 연출하거나, 때로는집요하게 드러낸 앨범입니다.
저희에게 [최저낙원]은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분석해가면서, 여러 차례 파고들어가게 만드는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두 단어를 연결한 앨범 제목처럼,
긴 시간 곁에 두고 깊게 들을만한 앨범이라고, 조심스레,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소개해 봅니다.
팀비스포크 올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