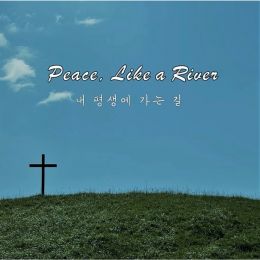하은지
손끝에서 흩어낸 음표들에 의미를 붙여 묶어두지 않으면 그대로 뼛가루가 되어 부서질 것만 같아서. 아무도 모르는 외진 골방에서 태어난 들꽃처럼, 존재의 여부조차 이 세상에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너는 고귀하다며, ‘도’야 ‘레’야 너희는 언젠가 반드시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봄빛 여울진 소나기를 피울 거야, ‘미’야 온 세상이 네 목소리에 귀 기울일 날이 올 거야, ‘솔’아 추위를 견뎌내고 우리 함께 푸른 벌판과 흰 나비를 보자, 그렇게 꾸역꾸역,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세상 온갖 미사여구를 내 선율 위로 무참히 쏟아내며 억지로라도 웃던 나날.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다독이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없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다. 평생에 걸쳐 가꿔온 내 마음의 꽃밭이 시들어 버릴까 겁을 내면서도, 물뿌리개에 먼지 뿌옇게 쌓이도록 눈길조차 두지 않던, 반쯤 넋이 빠져있던, 그런 무색(無色)의 날들이었다. 와중에 속으로는 모순되게도, 그곳에 살고 있는 소녀를 세상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병적인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도태 외면 불공평 따위가 두려운 것 아닌, 지친 내가 소녀를 세상에 내어줄까, 하는 겁. 당신들 말이 맞다. 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노력과 소망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 손발이 부르트도록 뛰어 봐도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게 있다. 맞아, 나는 특별하지 않고,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 인정하며 소녀를 세상에 내어줄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나를 믿으며 귀하다 다독이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도처럼 불어나 결국 온 몸을 집어삼켰을 때 ㅡ 나는 미련하게도 두 눈을 뻐끔뻐끔 뜬 채 콩알만 한 기포를 뱉어내며, ‘훌쩍 도망치고 싶다.’ 는 결심을 했다. 차라리 안개만이 가득한 숲 속으로. 겨울과 눈보라가 도사리는 저 먼 땅 끝으로. 아무도 날 알지 못하고 나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먼지 같은 세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함은,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에. 여전히 소망함은, 나는 연약하지만 강함 되신 누군가를 뚜렷이 알기에. ‘감사’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단한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강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매일 감사 거리를 찾으려 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어도.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무색과 유색의 경계에서.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몫을 다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