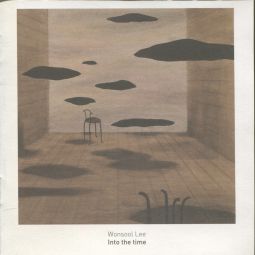1.
지난 2012년 1월, 낯익은 이름이 적힌 앨범 하나가 평소 애용하는 온라인 음반 매장의 재즈 섹션에 떴다. 무대 뒤에서 만났던 그가 조만간 첫 리더작을 발표한다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시선을 끌던 재킷 디자인과 앨범 소개를 위해 적힌 문구가 심상치 않았다. 그 앨범이 [Point Of Contact]였다. 주인공은 베이시스트 이원술. 재즈와 클래식의 성공적인 융합을 이끌어낸 이 앨범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3의 물결(Third Stream)’로 얘기됐고, 이듬해 2월 제10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재즈 음반”을 수상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2014년 봄, 이원술은 두 번째 리더작을 들고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간간이 마주칠 때마다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전하면, 그는 늘 멋쩍은 미소로 답을 대신하곤 했다. 생각해 보면 부담이 적지 않았겠다. [Point Of Contact]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물이자 시선을 끄는 문제작이었으나, 그의 입장에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모았던 모양이다. 유일한 아쉬움은 9명이란 작지 않은 편성 탓에 많은 공연을 치르지 못했다는 점이랄까. 이제 새 앨범의 타이틀은, “시 간 속 으 로”.
2.
[Into The Time]은 제목만으로도 작품의 인상을 매우 명료하게 드러낸다. 조금만 눈썰미가 있다면 이 앨범의 곡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주인공이 겪고 생각한 것들이 차분하게 그려지며, 시각에 따라서는 그 하루의 일상이 삶 전체의 모습으로 확대돼 비춰지기도 한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Into The Time]은 일종의 컨셉트 앨범이며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전개된 내러티브를 주요한 감상 포인트로 제시한다. 처음부터 설정된 의도에 따라 곡을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눈여겨볼 대목은, 앨범을 구성한 10개의 곡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채 개연성을 획득하고 설득력 있는 흐름을 구축해낸다는 사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아침을 맞아 일어나려 하지만 꿈에 본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힌다(New Morning). 자연스레 생각이 다다른 곳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Retrograde II).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뿐이다(I Hope You Smile Again).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상 속에 몸을 던진다. 삶은 빡빡하기만 한 긴장의 연속(Welcome To Life). 나이를 먹으면서 그 긴장도 익숙해지고 심지어 스스로에게 시니컬해질 때도 있건만(Get Used To It), 때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존재가 삶을 조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Beyond We Know). 그럼에도 하루가 마무리되면 어쩔 수 없이 처음 길을 나섰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Returning). 하루 만에 무슨 변화가 있었으랴만, 돌이켜 보니 마치 긴 여행을 한 것처럼 아뜩하게 느껴진다(A Day's Journey).”
구체적인 단상과 무관하게, [Into The Time]은 듣는 이에게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하거나 구상적인 멜로디 라인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대신, 곡마다 풍기는 짙은 아우라는 왠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 이 부분은 음악적으로 [Into The Time]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 재즈계가 완성해낸 주요 작품 중에서도 이렇듯 세련된 정중동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구현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아마도 ‘I Hope You Smile Again’이나 ‘Welcome To Life’ 등이 싱글로서 재즈 팬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앨범 전체를 마치 하나의 모음곡(Suite)처럼 읽어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감상 태도라 믿는다.
이는, 함께한 다른 음악인들의 연주를 바라보는 데에도 효과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피아니스트 비안과 기타리스트 오정수, 그리고 트럼페터 조정현은 심사숙고를 거쳐 응축된 솔로를 선보이는 스타일의 연주자들이다. 묘한 것이, 때론 적지 않은 음량과 과감한 프레이징으로 거침없는 연주를 토해냈지만 앨범 어디에서도 과하다 싶은 흐름은 절대 찾아볼 수 없다. 그 또한 리더인 이원술이 지닌 의도를 충실히 이해하고 지지한 덕이었을까. 마치 오래도록 활동해온 밴드처럼 작품의 앙상블은 한 몸인 양 더없이 조화롭게 진행된다. 오정수가 인상적인 일렉트로닉스로 앨범의 흐름을 도운 것이나, 드러머 김영진이 평소와 달리 한결 넓은 공간을 설정한 채 연주에 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프랑스 출신의 하모니카 연주자 로랑 모르(Laurent Maur)의 차분한 숨결도 작품의 가치를 다듬는 데 큰 힘을 보탰다.
3.
외견상 [Into The Time]은 첫 리더작인 [Point Of Contact]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더구나 그 앨범에서 대부분의 작곡을 맡은 것도 이원술 본인은 아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Into The Time]은, [Point Of Contact]가 두 말 할 필요 없는 이원술의 작품이었음을 역으로 입증한다. 가능하면 두 앨범을 연이어 들어보라. 누구든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한 사람이 같은 표정으로 옷만 갈아입고 서 있는 셈이랄까.
앨범을 반복해 들으면서 내리게 된 또 하나의 결론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이원술이 실제론 다른 사람일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상상이었다. 베이시스트의 위상 때문인지 무대 위의 그는 항상 꿋꿋한, 흔들림 없는 조정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낭만주의자가 아니었을까. 뭐든 잘 될 거라면서 ‘쿨한 척’하다가도 누군가의 밭은 기침소리에 몸 둘 바 몰라 하는 동정의 내면.
나는 이 앨범을 통해 이원술이 감춰두었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불거진 ‘비극적 상상력’을 감지했다. 그가 엮어낸 서사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운 것도 이 때문이다. [Into The Time]의 여정은 결코 일개 필부의 일상적인 푸념으로 들리지 않는다. 소박한 듯하지만 안쪽에 들어찬 소신과 개성은 옹골차기 그지없다. 이원술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명료한 실체로 빛을 발하는 순간, 한국 재즈는 또 한 명의 소중한 스타일리스트를 손에 넣었다.
김 현 준(재즈비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