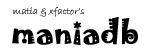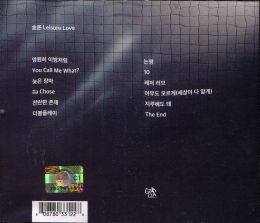[레저 러브], 삶의 양면적인 에너지가 관통하는 앨범.
2008년 발매된 흐른의 1집은 잘 다듬어진 신스 팝을 선사했다. 신시사이저는 곡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기기타와 드럼 프로그래밍은 댄서블한 그루브를 만들었다. [누가 내 빵을 뜯었나]와 [You Feel Confused As I Do], 그리고 [Global Citizen]을 지배하는 일렉트로니카는 80년대 신스 팝 리바이벌의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했다. 지금은 일종의 ‘대세’가 되었지만 3년 전의 인디 신에서, 그것도 솔로 싱어송라이터가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선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11년, 흐른의 2집은 전자음과 노이즈에 대한 심화학습의 결과물처럼 들린다. 전작의 사운드가 공간을 가로지르는 인상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소리로 공간을 넓히는 인상이다. 아날로그 신시사이저의 복고적인 톤이 입체감을 선사하는 [영원히 이 밤처럼]의 그루브를 지나면 둥둥거리는 베이스 라인 너머로 솟구치는 전기기타와 마주친다. 성실하게 소리를 쌓다가 마침내 하나로 뒤섞이는 소리의 설계는 톤 다운된 보컬과 대조를 이루며 독특한 감상을 자아낸다. 다소 낯설고 무뚝뚝한 첫 인상의 이성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왠지 그(녀)가 떠오르고 궁금해져 전화번호를 더듬는 것처럼, 후반부의 댄서블한 멜로디 라인이 마침내 부각된다. 80년대에 유행하던 유러피언 신스 팝의 자취를 물씬 담은 [늦은 장마]와 기타의 독특한 울림으로 시작되는 미니멀한 불어 노래 [Ta Chose] (따 쇼즈) 그리고 구식 가요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다가 그로테스크한 노이즈로 마무리하는 [찬란한 존재] 등은 앨범의 한쪽 인상을 정의한다.
앨범의 다른 면은 [더블플레이]와 [레저 러브],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다 알게)], 그리고 [지루해도 돼]의 댄서블한 비트가 만드는 세계다. 전작의 [Global Citizen]과 [누가 내 빵을 뜯었나]의 연장처럼 들리는 이 곡들은 신시사이저를 배경으로 전기기타의 톤이 겹겹이 칠해진 풍경화다. 특히 신스 팝과 트랜스의 경계를 오가는 [레저 러브]가 형성하는 영리한 공간감과 감수성은 이어지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다 알게)]와 [지루해도 돼]의 느릿한 그루브와 시리즈처럼 연결된다.
앨범을 틈틈이 채운 리버브와 그루브, 신시사이저와 전기기타가 만드는 입체적인 공간감이 귀를 유혹하고 몰입하게 만든다. 이 앨범이 잘 다듬어진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라는 인상을 남기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이것은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은 전자양의 익숙한 기타 톤과 리버브를 통한 공간감이 돋보이는 근거기도 하다.
또 하나, 이 앨범을 관통하는 정서는 ‘레저 러브’라는 상반된 이미지의 충돌이다. ‘레저’는 말 그대로 중산층의 관습화된 여가다. 반면 ‘러브’란 생을 통틀어 전력을 다하는 게 당연히 여겨지는 이데올로기다. 취미활동으로 수렴되는, 요컨대 잉여로서의 시간이 사랑이라는 삶의 지상과제와 부딪치는 충돌은 냉정한 일렉트로니카 사운드와 성찰적인 가사와 맞물리는 충격으로 전환된다. [레저 러브]를 정의하는 것은 이런 삶의 양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에너지다. 여기에는 [영원히 이 밤처럼]의 순간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희망도 있고 사랑마저 힘들 필요는 없다는 [레저 러브]의 선언도 있다. 유기동물의 비극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찬란한 존재]의 섬뜩한 순간도, 텔레비전 예능의 역할놀이가 잠식한 일상을 극복하는 [지루해도 돼]의 자기긍정도 있다.
무엇보다 흐른은 경험적 토대를 음악적 기반으로 삼는 동시에 소리가 만드는 효과도 놓치지 않는, 영리한 창작자다. 이 앨범을 통해 그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어 나는 기쁘다. 물론 당신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