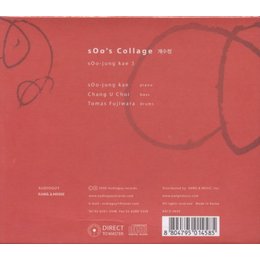그녀의 연주곡들 역시 재즈는 재즈다.
더구나 고급 와인바에서 머리와 다리를 조금씩 까닥이며 듣는 수준도 아니다. 자유롭다 못해 다소 낯선 느낌의 형식 파괴(확성기를 이용한 랩퍼의 랩이라던가, 피아노 현까지 퉁겨지는 파괴(?)까지 느껴진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낯설음은 마치 처음 보면 대단히 무뚝뚝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지극히 대인관계가 서툰 이를 대하는 느낌이다. 달콤하지도, 자상하지도, 친한 척도 하지 않지만 왠지 돌아서면 생각나는, ‘아주 드문 사람’을 보는 느낌이다.
아주 인간적이다.
인간사의 허망함을 알아버린 듯한 슬픔, 우울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어쩔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적 연민과 함께, 거리낌 없는 항변도 들려준다.
낯선 쿠바 땅 어느 냄새 나는 클럽에서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걸 잊고, 몇 안되는 악기 리듬에 몸을 맡기는 그런 자유로움을 던지는가 하면, 불쑥 발 빼고 싶던 그 끈적한 관계를 다시 그리워하게 만드는 대단히 인간적인 우울함도 함께 떠도는 그녀의 연주곡들...
자유롭고 우울하고픈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이 되길 바란다.
(방송작가 유진희) ....
 ....
....